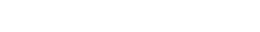성 문학예술
글 수 69
섹스가 봇물 터지듯
넘쳐흐르고 있다. 예전엔 비가 죽죽 내리는 조악한 스크린에 신성일
엄앵란이 키스하는 신만 나오더라도 난리가 났던 때도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때마다 휙- 휙-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희한하게도
언제나 스크린이 꺼져버리곤 했다. 그러면 또 관객들이 아우성을 쳤다. "돈
물어내라!"
그 때의 그 낭만이 어제인 듯 눈에 선한데, 이게 웬 일인가? 전라의 남녀들이 엉키고
설키는 우리의 에로(예술?) 영화가 보무도 당당히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
되었단다.
어디 그 뿐인가? 영화를 촬영하며 실제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둥, 십대 여학생이
전라로
연극 무대에서 연기한 것이 예술이라는 둥, 삼십대의 여성 연기자가 자신의 남성
편력을
책으로 출판한 게 외설이라는 둥, 온 천지가 모두 분홍 빛 화제! 섹스의 물결은 이제
사방에서 넘쳐흘러 거리 곳곳에 범람하고 있다. 때마침 현란한 테크노 음악과 함께
들려오는
가사 ---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렇군. 우리 나라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근데-, 정말 바뀌긴 바뀐 건가? 혹시 성에 대한 외형적 모습만 바뀐 건 아닐까?
매년 싱그럽게 젊어지는 대학생들을 지켜보면 가슴이 무거울 때가 많다. 90년대
초까지
대학을 휩쓸던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문화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스러져버리자, 그
후로
대학가에 나타난 '향락 문화' 현상-- 타인의 감정과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
말초신경의 순간적 쾌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랑을 쓰시려면 연필로 쓰세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오늘 저녁 썼다가 수틀리면 내일 아침 지워버리고 마는 짧은 사랑의
주인공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이게 과연 참된 성의 개방일까?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외형적 현상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왜곡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성에
대해서 억눌린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건 아닐까?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어쩐지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러면서도 늘 접하는 섹스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불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하기란
너무 힘이 들고... 그럼, 뭐, 할 수 있나? 참을 수는 없고(또는 참기는 싫고), 에라,
내숭을
떠는 한이 있어도 뒤로 호박씨를 까거나 남몰래 살짝 부뚜막에 올라가는 수밖에.
'섹스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같은 본능적 행위중의 하나일 뿐이야. 지나가는
어린애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듯이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몸짓중의 하나일 뿐이야.'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다.
억눌린 성, 그래서 부뚜막에 올라간 섹스! 그것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대중문화에
범람하고 있는 성문화의 일반적 현상이 아닐까?
흔히 사랑이란 이성에 대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다.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그 다섯 번 째 '애(愛)'의
'사랑'은 하
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우리 인간의 허망한 감정중의 하나일 뿐, 동서고금의 수많은
지성인과
시인묵객들이 예찬한 '사랑의 영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성'이란 순간적인 그러한 얄팍한 감정에서 비롯된 '교미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성(性)은 Good Sex, 완벽하고 아름다운 섹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두 개의 우주가 하나로 만나 또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영혼과 육체의 만남,
그 음양의 조화가 성(性)인 것이다.
지나가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는 작은 몸짓에도 삶의 사려 깊은 철학이 엿보여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인간의 자웅(雌雄)이 육체로 만남에 있어서 일러 무엇하겠는가!
무엇이 Good Sex인지 다음 주에 보다 진솔하게 얘기를 풀어보겠거니와, 우선 당장
우리도 이제는
부뚜막에서 내려와 긍정적 자세로 당당하게 성(性)의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KIS 칼럼니스트 김용표박사
넘쳐흐르고 있다. 예전엔 비가 죽죽 내리는 조악한 스크린에 신성일
엄앵란이 키스하는 신만 나오더라도 난리가 났던 때도 있었는데...
재미있는 건 그 때마다 휙- 휙-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희한하게도
언제나 스크린이 꺼져버리곤 했다. 그러면 또 관객들이 아우성을 쳤다. "돈
물어내라!"
그 때의 그 낭만이 어제인 듯 눈에 선한데, 이게 웬 일인가? 전라의 남녀들이 엉키고
설키는 우리의 에로(예술?) 영화가 보무도 당당히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
되었단다.
어디 그 뿐인가? 영화를 촬영하며 실제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둥, 십대 여학생이
전라로
연극 무대에서 연기한 것이 예술이라는 둥, 삼십대의 여성 연기자가 자신의 남성
편력을
책으로 출판한 게 외설이라는 둥, 온 천지가 모두 분홍 빛 화제! 섹스의 물결은 이제
사방에서 넘쳐흘러 거리 곳곳에 범람하고 있다. 때마침 현란한 테크노 음악과 함께
들려오는
가사 ---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렇군. 우리 나라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근데-, 정말 바뀌긴 바뀐 건가? 혹시 성에 대한 외형적 모습만 바뀐 건 아닐까?
매년 싱그럽게 젊어지는 대학생들을 지켜보면 가슴이 무거울 때가 많다. 90년대
초까지
대학을 휩쓸던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문화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스러져버리자, 그
후로
대학가에 나타난 '향락 문화' 현상-- 타인의 감정과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
말초신경의 순간적 쾌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랑을 쓰시려면 연필로 쓰세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오늘 저녁 썼다가 수틀리면 내일 아침 지워버리고 마는 짧은 사랑의
주인공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이게 과연 참된 성의 개방일까?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외형적 현상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왜곡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성에
대해서 억눌린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건 아닐까?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어쩐지 남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러면서도 늘 접하는 섹스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불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하기란
너무 힘이 들고... 그럼, 뭐, 할 수 있나? 참을 수는 없고(또는 참기는 싫고), 에라,
내숭을
떠는 한이 있어도 뒤로 호박씨를 까거나 남몰래 살짝 부뚜막에 올라가는 수밖에.
'섹스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같은 본능적 행위중의 하나일 뿐이야. 지나가는
어린애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듯이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몸짓중의 하나일 뿐이야.'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다.
억눌린 성, 그래서 부뚜막에 올라간 섹스! 그것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대중문화에
범람하고 있는 성문화의 일반적 현상이 아닐까?
흔히 사랑이란 이성에 대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다.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그 다섯 번 째 '애(愛)'의
'사랑'은 하
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우리 인간의 허망한 감정중의 하나일 뿐, 동서고금의 수많은
지성인과
시인묵객들이 예찬한 '사랑의 영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성'이란 순간적인 그러한 얄팍한 감정에서 비롯된 '교미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성(性)은 Good Sex, 완벽하고 아름다운 섹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두 개의 우주가 하나로 만나 또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영혼과 육체의 만남,
그 음양의 조화가 성(性)인 것이다.
지나가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는 작은 몸짓에도 삶의 사려 깊은 철학이 엿보여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인간의 자웅(雌雄)이 육체로 만남에 있어서 일러 무엇하겠는가!
무엇이 Good Sex인지 다음 주에 보다 진솔하게 얘기를 풀어보겠거니와, 우선 당장
우리도 이제는
부뚜막에서 내려와 긍정적 자세로 당당하게 성(性)의 올바른 가치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KIS 칼럼니스트 김용표박사